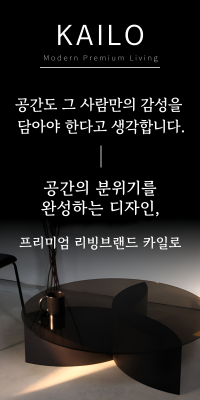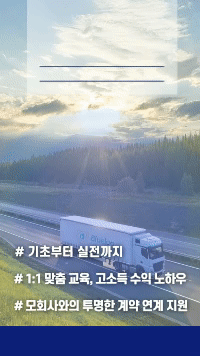-
-
COP30 브라질 개막…“지구의 마지막 10년, 행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
198개국 대표단 베렘 집결, 기후금융·화석연료 감축·손실보상 기금이 핵심 의제로
-
전 세계의 시선이 브라질 북부 도시 베렘(Belém)에 모였다.10일(현지시간) 개막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지구의 마지막 10년”이라는 경고 속에 전례 없이 높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는 198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 7만여 명이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해법을 논의한다.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첫째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최대 쟁점이다. 선진국들이 2009년 코펜하겐 협약에서 약속했던 연간 1,000억 달러 지원이 여전히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둘째는 화석연료 감축(Fossil Fuel Phase-out) 논의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여전히 석탄·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감축(phase-down)’이 아닌 ‘단계적 퇴출(phase-out)’ 문구를 명문화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셋째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 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다. 이미 기후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저지대 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재원 배분 방식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개막식에서 COP30 의장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André Corrêa do Lago)는 “부유국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열의를 잃고 있다”며 “지금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파리협정의 목표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생존문제이며, 모든 국가는 책임과 행동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사전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도 우려가 확인된다. 보고서는 2023년, 2024년, 2025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책으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2.7 ℃까지 치솟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파리협정이 정한 1.5 ℃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이번 회의의 개최지 베렘은 ‘아마존의 관문’으로 불리는 도시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복원을 COP30의 상징 의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브라질 내 석유 시추 확대와 삼림벌채 문제로 인해 “녹색 외교와 현실의 괴리”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국제 환경단체들은 이번 회의를 “인류의 방향 전환점”으로 규정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성명을 통해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국이 화석연료 감축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회의는 2주간 진행되며, 오는 22일 폐막식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지도자 선언문(Leaders Declaration)’이 채택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2030년 이후 되돌릴 수 없는 경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이번 COP30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시험대가 되고 있다.베렘 하늘 아래에서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1.5도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Source: UN Climate Change / COP30 Belém 2025, official media image (free for journalistic use) Copyrights ⓒ 더딜리버리 & www.thedeliver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글쓴날 : [25-11-11 09:23]
-

대표자명 : 김민성 , 상호 : 주식회사 더딜리버리 , 주소 : 미사강변한강로 135 나동 211호
발행인 : 김민성, 편집인 : 김대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4462
Tel : 010-8968-1183, Fax : 031-699-7994 , Email : tdy0528@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430-86-0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