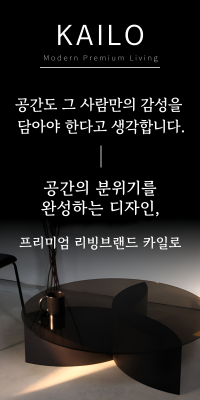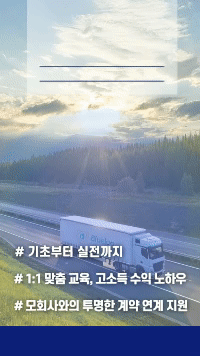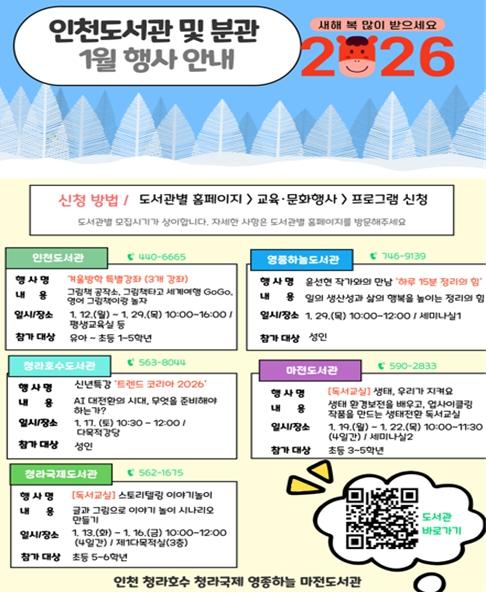-
-
‘위고비 한 방에 살 뺀다’…새해 다이어트 풍경 바꾼 약의 힘
-
운동 대신 ‘한 달 40만 원 주사’ 열풍, 피트니스 업계 한파
“근육까지 빠진다”…전문가들 “약은 보조 수단일 뿐” 경고
‘가성비 다이어트’ 확산 속, 건강관리 패러다임 변화 신호탄 -

사진=유토이미지 매년 연말이면 헬스장이 ‘신년 다이어트족’으로 붐비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운동 대신 주사 한 방으로 체중을 줄이는 ‘의학 다이어트’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피트니스 업계가 이례적인 비수기를 맞았다.‘꿈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마운자로가 일상으로 스며든 것이다. 강남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는 “예전 같으면 새해 등록 문의가 폭주했는데, 요즘은 ‘운동은 힘드니 위고비 맞을까 고민된다’는 문의가 더 많다”고 전했다.비만치료제의 인기는 단연 ‘가성비’에서 비롯됐다. 강남권 PT 10회가 60만~80만 원 수준인 반면, 위고비 한 달 투약비는 30만~40만 원 정도다. 가격은 절반인데 체중감량 효과는 4~6kg, 즉 눈에 띄게 빠르다. 한 달만에 옷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험담이 SNS에 확산되자 2030부터 5060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직장인 이모(28) 씨는 “위고비를 맞으면 식욕이 확실히 줄어든다”며 “운동하면 오히려 어지럽고 기운이 빠져서 주사 맞는 동안은 쉬는 중”이라고 말했다. 58세 여성 환자 A씨도 “예전에는 굶어도 3개월에 2kg 빠지기 힘들었는데, 주사 맞고 나서는 하루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이런 분위기에 헬스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여성전용 피트니스 관계자는 “운동 대신 약을 택하는 회원이 늘어 새해 등록률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잠실의 한 트레이너도 “회원이 ‘병원에서 약 처방받을 거니 환불해달라’는 사례가 실제 생겼다”고 전했다.다만 모든 헬스장이 위축된 것은 아니다. 송파구의 한 웨이트 전문 피트니스 대표는 “몸을 만드는 목적의 회원층은 비교적 영향이 적다”며 “다이어트 목적 회원과는 시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이 운동 수요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의 효능을 인정하면서도 “운동 없는 체중감량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면 식욕이 급격히 줄면서 근육량이 함께 감소하기 쉽다”며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약을 끊었을 때 체중이 더 쉽게 요요 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약을 복용해도 최소 주 3회, 30분 이상 유산소 및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며 “비만치료제는 운동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치료 보조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유행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 소비심리 연구자는 “다이어트조차 효율과 비용 중심으로 판단하는 ‘가성비 세대’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운동을 대신할 기술·약물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며 ‘건강 관리’의 개념이 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피트니스 업계는 생존 전략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부 센터는 ‘체성분 유지 PT’, ‘약물 병행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새로운 메뉴를 도입해 수요 변화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약으로 살을 빼는 건 쉬워졌지만, 건강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헬스 트레이너 김모 씨의 말처럼, 다이어트의 무게중심은 ‘빼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Copyrights ⓒ 더딜리버리 & www.thedeliver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글쓴날 : [25-12-22 09:58] -

대표자명 : 김민성 , 상호 : 주식회사 더딜리버리 , 주소 : 미사강변한강로 135 나동 211호
발행인 : 김민성, 편집인 : 김대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4462
Tel : 010-8968-1183, Fax : 031-699-7994 , Email : tdy0528@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430-86-0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