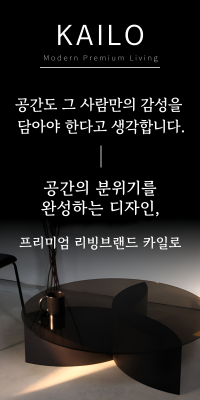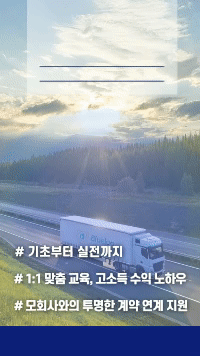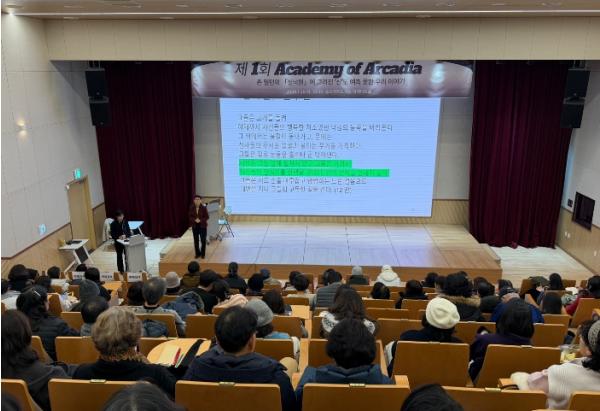-
-
미국, ‘섹션 301’로 중국 해운·조선 압박 강화
-
항만 수수료·관세·장비 제재 확대… 미중 물류 갈등,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
-
2025년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물류·해운 전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중국의 해운·조선·물류 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두 나라의 항만 정책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해상 물류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Section 301은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나 각종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USTR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해운·조선 산업이 국가 주도 보조금과 불공정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미국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중국 선박과 장비를 대상으로 한 단계 높은 규제 패키지를 시행에 들어갔다.새 조치의 핵심은 ‘항만 서비스 수수료’다.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선박 톤수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컨테이너 크레인, 인터모달 섀시, 화물 하역 장비 등 주요 해운 장비에는 최대 10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측은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해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USTR은 일부 유예 조항도 마련했다. 미국 내에서 동등한 규모의 선박을 신규로 주문하거나 인도받는 선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소급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유예 아닌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중국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중국 교통부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 해운 질서를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자국 항만을 이용하는 미국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의 수수료 정책 시행일과 동일한 10월 14일부로 발효됐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조치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이 중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서, 이번 조치가 한중 간 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공급망 패권 경쟁’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해운과 조선 산업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와 달리 물류 인프라의 핵심으로, 한 번 구조가 바뀌면 복원이 어렵다. 미국이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지배력 약화를 노리는 이유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의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이번 제재의 파급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항만을 드나드는 중국 선박의 운항 비용이 급등하면서 운임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항만 체류 시간 증가로 인한 혼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산 장비나 부품을 사용하는 제3국 기업들까지도 관세 부담을 지게 돼, 글로벌 물류망 전반의 공급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중국의 보복 조치가 추가될 경우, 미중 간 ‘항만 수수료 전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이는 곧 해운 운임의 불안정성, 환적 항만의 혼잡, 그리고 글로벌 교역 흐름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시아–미국 노선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대만의 물류 기업들은 정책 리스크 관리와 루트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이번 Section 301 조치는 무역정책을 넘어선 ‘해상 주도권 전쟁’의 신호탄이다. 미국은 산업 보조금과 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중국은 항만 요금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서로의 해상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물류 산업은 다시금 지정학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출처: Caixin Global, Gallery: Empty Shipping Containers Pile Up
Copyrights ⓒ 더딜리버리 & www.thedeliver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글쓴날 : [25-10-17 14:05] -

대표자명 : 김민성 , 상호 : 주식회사 더딜리버리 , 주소 : 미사강변한강로 135 나동 211호
발행인 : 김민성, 편집인 : 김대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4462
Tel : 010-8968-1183, Fax : 031-699-7994 , Email : tdy0528@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430-86-0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