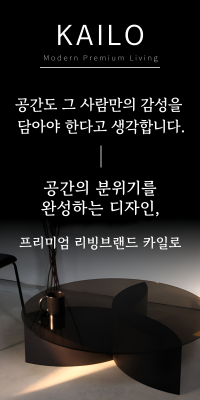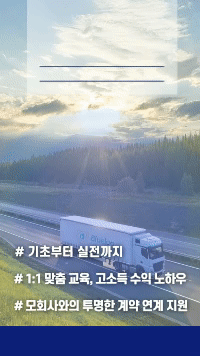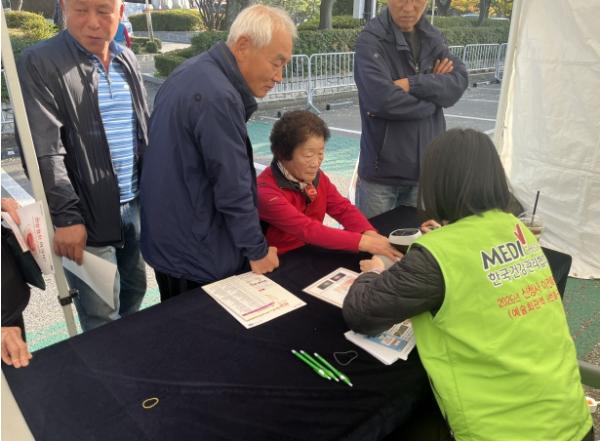-
-
지역 간 물류비 격차 확대, 신흥국 물류망 여전히 비용·시간 부담 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리드타임·운송비 차이 심화… 인프라와 통관 효율성의 구조적 격차가 원인
-
2025년 하반기, 글로벌 물류망의 양극화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급망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물류비와 운송시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따르면 고소득국의 물류 효율은 저소득국보다 평균 40~5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인프라 구축 수준, 통관 절차의 투명성, 운송 네트워크의 신뢰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EasyCargo3D 세계무역기구(WTO)도 2020년 발표한 ‘총물류비용(Total Transport and Logistics Costs)’ 보고서에서 “리드타임이 길고 지연이 잦은 국가는 재고비·지체비용·보관비가 모두 증가한다”며, 개발도상국의 물류 효율이 낮을수록 전체 비용 구조가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용은 단순 운임뿐 아니라 재고 유지비, 창고 운영비, 자본 회전 속도 등 공급망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2025년판 ‘Agility 신흥시장 물류지수(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신흥시장 5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선진시장 대비 리드타임이 길고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물류 인프라와 도로망 부족, 복잡한 통관 절차로 인해 리드타임이 평균 20~40%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과 북미는 디지털 물류 관리와 통관 자동화 덕분에 운송 예측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단순한 물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역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운송시간 격차가 커질수록 기업들은 공급망을 단축시키거나 재고를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결국 물류비와 리드타임 격차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과 제도 효율성’의 문제다. 선진국은 항만·도로·통관의 디지털화를 통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신흥국은 여전히 인프라 부족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전문가들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송비 절감이 아닌, 전자통관·공공물류데이터 구축·인프라 투자 등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Copyrights ⓒ 더딜리버리 & www.thedeliver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글쓴날 : [25-10-25 22:13] -

대표자명 : 김민성 , 상호 : 주식회사 더딜리버리 , 주소 : 미사강변한강로 135 나동 211호
발행인 : 김민성, 편집인 : 김대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4462
Tel : 010-8968-1183, Fax : 031-699-7994 , Email : tdy0528@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430-86-0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