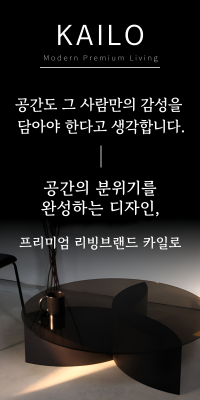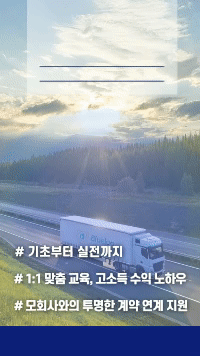-
-
신흥국이 불붙인 초고속 생활물류 전쟁 — 아시아·남미가 주도하는 ‘속도의 경제’
-
인도와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이커머스와 초단기 배송 경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생활물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
전 세계 생활물류의 중심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서는 이커머스의 급성장과 함께 초단기 배송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속도가 곧 시장 점유율’이라는 공식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

출처: Business Today India 가장 치열한 전장은 인도다. 타타그룹 계열의 빅바스킷(BigBasket)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인도 전역에서 10분 내 배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다크스토어(도심형 소형 물류 거점)를 현재 700개에서 1,200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쟁사인 리라이언스 그룹의 지오마트(JioMart) 역시 퀵커머스 부문 주문량이 분기 기준 200% 이상 급증하며, 인도 내 600개 이상의 거점을 통해 배송 속도 단축에 나서고 있다.동남아시아는 ‘디지털 경제 성장’이 생활물류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글·테마섹·베인이 공동 발표한 ‘e-Conomy SEA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스트마일 인프라와 트래킹 기술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송(CEP) 시장은 2025년 91억 9,000만 달러에서 2029년 15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역시 교차보더(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생활물류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계 플랫폼 테무(Temu)가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규제 리스크도 나타나고 있다.남미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2024년 말 수입 규제 완화 이후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유럽·미국 플랫폼의 물류망이 빠르게 확장됐다. 라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메르카도리브레(Mercado Libre)는 멕시코 시장에만 34억 달러 규모의 물류·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며, 초고속 배송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무료배송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속도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아시아와 남미의 생활물류는 ‘속도’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도시마다 마이크로 물류 거점이 빽빽이 들어서고, 배송 차량이 분 단위로 움직인다. 글로벌 라스트마일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5년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속도의 경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배송 비용, 인력 부족, 도심 교통 규제 등 새로운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무료배송 정책이 소비자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고 물류 인프라 투자 여력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송 속도보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신흥시장에 특화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다크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물류 모델이 확대되고, 남미에서는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과 고정밀 트래킹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소형·공유형 물류 거점 모델을 중심으로, ‘배송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활발하다.2025년의 신흥국 생활물류는 단순한 운송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누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나라가 곧 다음 세대 글로벌 물류의 주도권을 거머쥘 것이다.
Copyrights ⓒ 더딜리버리 & www.thedeliver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글쓴날 : [25-11-04 16:18] -

대표자명 : 김민성 , 상호 : 주식회사 더딜리버리 , 주소 : 미사강변한강로 135 나동 211호
발행인 : 김민성, 편집인 : 김대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4462
Tel : 010-8968-1183, Fax : 031-699-7994 , Email : tdy0528@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430-86-03385